[Global Trend]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광고읽기 I
2011.05.23 05:09 광고계동향,
조회수:7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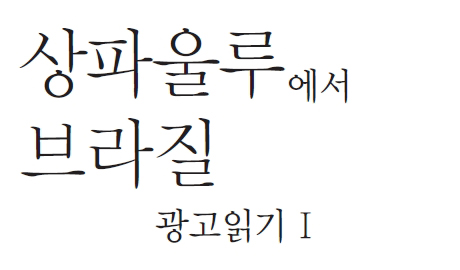

글 ㅣ 정길화 국장 (MBC 상파울루 주재 남미특파원)
필자가 MBC 초대 남미특파원으로서 ‘떠오르는 나라’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넘었다. ‘두 얼굴의 나라’, ‘영원한 미래의 나라(오늘의 나라가 아닌)’ 갖가지 별명을 가진 브라질에 도착하였는데 아직 코끼리의 다리도 못 만진 신세다. 치안이 안 좋아서 혼자 나다니기가 위험하다고 하니 해만 지면 또는 휴일 대낮에도 꼼짝 못하고 호텔에서 ‘방콕’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못 알아먹는 TV 줄창 틀어놓기다.
한 달 반 속성 과외로 서바이벌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온 나에게 브라질 방송은 요령부득이지만 그래도 직업에서 오는 관록으로 방송의 흐름을 대충 때려잡는다. 리오의 학교에서 난 총기사고가 연일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지난여름(1월)에 난 홍수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곧 세기의 이벤트라는 윌리엄과 케이트의 결혼식에 구 유럽을 모태로 하고 있는 브라질이 본토 못지않은 열광을 할 낌새다.
그런 가운데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글로보, 헤꼬르, SBT 등 5대 방송사가 모두 상업방송인 이곳에서 광고는 방송사의 주요한 재원이다. 자동차, 통신사, 화장품, 식품, 다이어트 광고 등 온갖 제품의 광고가 출몰하는 가운데 HSBC 은행의 광고가 자주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페인계 산탄데르 은행과 함께 최근 브라질에서 부상하는 외국계 은행 중의 하나라고 한다.
시작은 ‘1983년 상파울루’라는 자막과 함께 젊은 아빠가 아기를 위해 피아노를 친다.(재즈풍인데 곡목은 모르겠다. 녹음해 두었다가 카톡스로 한국의 지인에게 제목을 물어봐야지.....) 이윽고 ‘2011년 뉴욕’으로 자막이 바뀌고 그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그도 한 아기를 키우고 있다. 엄마는 안 보이는 가운데 아기가 칭얼거리자 아빠는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그러자 상파울루의 그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에게 옛날의 그 피아노곡을 연주해 준다. 라라라라라..
필경 미국, 브라질 등 세계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자장가처럼 - 세계화 시대에 금융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는 것이 이 광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콘셉이 왕년에 한국의 어느 핸드폰 광고하고 비슷해서 처음에는 핸드폰 광고가 아닌가 해서였고(왜 그 유명했던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데 아빠가 아기를 돌보다가 우는 아기를 감당 못하고 녹화장에 있는 엄마에 게 전화를 하자 그 바쁜 엄마가 ‘잘 자라 우리 아기..’를 부르던 광고 말이다... 다음으로는 왜 저 집은 대를 이어(?) 아기 옆에 엄마가 없나...라는 한국적 사고 때문이었다. ^^)
한 달 반 속성 과외로 서바이벌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온 나에게 브라질 방송은 요령부득이지만 그래도 직업에서 오는 관록으로 방송의 흐름을 대충 때려잡는다. 리오의 학교에서 난 총기사고가 연일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지난여름(1월)에 난 홍수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곧 세기의 이벤트라는 윌리엄과 케이트의 결혼식에 구 유럽을 모태로 하고 있는 브라질이 본토 못지않은 열광을 할 낌새다.
그런 가운데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글로보, 헤꼬르, SBT 등 5대 방송사가 모두 상업방송인 이곳에서 광고는 방송사의 주요한 재원이다. 자동차, 통신사, 화장품, 식품, 다이어트 광고 등 온갖 제품의 광고가 출몰하는 가운데 HSBC 은행의 광고가 자주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페인계 산탄데르 은행과 함께 최근 브라질에서 부상하는 외국계 은행 중의 하나라고 한다.
시작은 ‘1983년 상파울루’라는 자막과 함께 젊은 아빠가 아기를 위해 피아노를 친다.(재즈풍인데 곡목은 모르겠다. 녹음해 두었다가 카톡스로 한국의 지인에게 제목을 물어봐야지.....) 이윽고 ‘2011년 뉴욕’으로 자막이 바뀌고 그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그도 한 아기를 키우고 있다. 엄마는 안 보이는 가운데 아기가 칭얼거리자 아빠는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그러자 상파울루의 그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에게 옛날의 그 피아노곡을 연주해 준다. 라라라라라..
필경 미국, 브라질 등 세계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자장가처럼 - 세계화 시대에 금융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는 것이 이 광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콘셉이 왕년에 한국의 어느 핸드폰 광고하고 비슷해서 처음에는 핸드폰 광고가 아닌가 해서였고(왜 그 유명했던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데 아빠가 아기를 돌보다가 우는 아기를 감당 못하고 녹화장에 있는 엄마에 게 전화를 하자 그 바쁜 엄마가 ‘잘 자라 우리 아기..’를 부르던 광고 말이다... 다음으로는 왜 저 집은 대를 이어(?) 아기 옆에 엄마가 없나...라는 한국적 사고 때문이었다. ^^)

그러나 사실 이 광고가 내 눈길을 끈 것은 차분한 비주얼과 알기 쉬운 로직, 연기자들의 실감나는 표정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브라질 TV에서 흔히 보는 여느 다른 광고들이 정열적이고 원색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과 달리 이 광고는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소구력도 있는 편이다. 글래머 모델의 비키니가 판을 치는 브라질 방송 화면에서 역으로 가는 전략인가. 하긴 안정감과 신용을 부각해야 하는 은행 광고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이 광고의 맨 마지막 카피는 “NO BRAZIL E NO MUNDO”다. 헐 이게 무슨 소리? no라면 평생 부정어의 no로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이 말은 얼핏 ‘브라질도 안 되고, 세계에서도 안 되고...’로 보일 법도 하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를 달포 배운 나는 당황하지 않고 정신 줄을 수습한다. 포어에서 no는 전치사 +관사다. 즉 이 말은 ‘브라질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란 뜻이 되겠다. 역시 세계화 시대의 은행 광고다. 적어도 이 광고에서는 브라질이 세계화와 개방을 표방하고 있다. HSBC도 영업 전략상 그것을 노리고 편승하고 있으리라.
이처럼 특파원에게 현지 방송의 TV 화면은 해당국의 주요 사건이나 현장뿐 아니라 그 나라의 ‘지금 이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한 창문이다. 때로는 현상적 측면 외에 그 이면의 구조나 메커니즘까지 파악해야 한다. 내친 김에 브라질의 광고 산업계를 들여다본다. 떠나올 때 한국 방송계와 광고계의 복잡한(?)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잡고 있음을 보았던 터에 브라질에서 혹시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은 없는지도 미상불 궁금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광고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전체 광고 시장은 2009년에 비해 17.7% 성장했는데 291억 헤알(R$ 1헤알은 1.56 달러, 한국 돈으로는 근 700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지상파 TV의 광고 매출은 최근 20년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상파 TV의 2010년 광고는 200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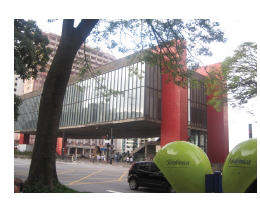 21.6% 성장했다(R$ 135억에서 R$ 164억으로). 지상파의 점유율은 2010년에 63%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지상파 TV 광고 시장 매출 규모는 미국과 일본 다음이라고 한다. 원래도 높은 편이지만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2010년 월드컵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21.6% 성장했다(R$ 135억에서 R$ 164억으로). 지상파의 점유율은 2010년에 63%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지상파 TV 광고 시장 매출 규모는 미국과 일본 다음이라고 한다. 원래도 높은 편이지만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2010년 월드컵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동기간 라디오는 광고 시장에서 10.9% 성장을 기록(R$ 9억8천만에서 R$ 10억9천만으로)했다고 한다. 또한 케이블은 22.9%, 잡지는14.9%, 인터넷이 28%, 영화가 13%, 옥외광고가 15.3%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2010년은 전 광고계 대박의 해였음에 틀림없다. 다만 신문의 경우 점유율이 2009년 14.1%에서 지난해 12.4%로 하락하였고, 라디오의 점유율은 2009년 4.4%에서 지난해 4.2%로 하락, 잡지의 점유율은 2009년 7.7%에서 지난해 7.5%로 하락했다니 브라질도 미디어별로 갈수록 음지 양지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양이다. (참조사이트 : http://www.institutotavola.com.br/tag/mercado-publicitario)
이런 마당이니 지상파 TV 광고가 크리에이티브의 각축장이 될 것임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왕년에 브라질은 정정의 불안,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알려진 나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것이 카르도수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을 지나면서 정치가 안정이 되었고,
 특히 90년대 헤알화 정책 이후로 물가가 점차 안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의식주 이외의 문화적 향수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광고 시장이 동반 성장한 것으로 풀이하는 이도 있다.
특히 90년대 헤알화 정책 이후로 물가가 점차 안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의식주 이외의 문화적 향수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광고 시장이 동반 성장한 것으로 풀이하는 이도 있다.목하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의 상업중심지인 상파울로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다국적 회사가 다수 진출해 있고 이들과의 합작 광고사도 나와 치열한 경쟁 중에 있다고 한다. TV 외에 옥외 광고 등에도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다. 아직 포어가 취약해 이들 광고의 콘셉과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주얼이나 로직에 대해서는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는 소구력이 있음을 느낄 수는 있다. 무엇보다 필자 또한 한 사람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는 브라질 광고의 크리에이티브가 갖는 차별성과 창의성의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고 눈길을 끄는 광고를 업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능력이 닿으면 광고 산업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