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CASE] 난 이제 더 이상 ‘병맛’이 아니에요
2014.06.30 10:38 INNOCEAN Worldwide,
조회수:4618

Tex t. <Life is Orange> Editorial Dept
난 이제 더 이상 ‘병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수한 센스와 넌센스가 존재한다. 센스는 무엇이고, 넌센스는 무엇일까? 센스와 넌센스를 가르는 기준은? 어쩌면 모든 센스는 ‘넌센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Nonsense makes sense. 이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남보다 한발 먼저 될성부른 넌센스를 포착, 센스로 빚어내는 네 명의 트렌드세터에게 물었다. What’s the next NON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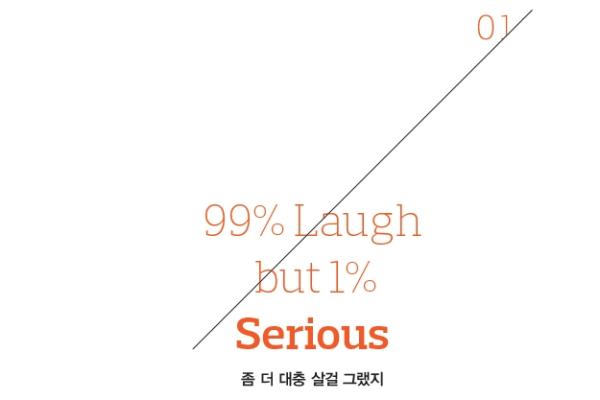
나는 전자책 서비스 기획자다. 디자이너다. 그리고 SNS 시인이다. 솔직히 <서울 시>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런데이미 무료 전자책으로 서비스했던 걸 도대체 누가 사서 읽는 걸까?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는 단행본이 그야말로 넌센스! 너무 용감하기만 해서 안 뜰 줄 알았던 ‘용감한 녀석들’ 만큼이나 신선한 충격이랄까. 주변에선 워낙 ‘특이한 놈’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냈다고 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더라. 혹자는 <서울 시>를 두고 일본의 하이쿠(俳句)에 빗대기도 하고, 혹자는 귀여니의 <아프리카>에 빗대기도 한다. 글쎄, 그런 게 중요한가? 난 그저 내 생각을 틈틈이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고, 친구들 반응이 좋았을 뿐이고, 심심풀이로 회사 전체 메일로 돌렸을 뿐이고, 마침 우리 회사가 전자책 출판사였을 뿐이고! 나는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시인, ‘시인’이란 말에 집착하지 않는 시인, 긴 글이 싫어서 키도 안 큰 시인이다. Why so serious? 그러나 99%가 웃음이라면 1%의 진지함이 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웃음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건 싫잖아. 언젠가는 <서울 시>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랑곳 않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만큼 줄기차게 쓸 테다.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살다가 운 좋게 걸리면 장땡! 참, 주변에서 하도 물어봐서 미리 대답한다. <서울 시>에 영감 이런 건 없다. 제목부터 먼저 정한 다음, 글자를 넣었다 뺐다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나름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서울 시도 시냐?”고 무시하지 마라. 마음만은 ‘특별 시’니까!
하상욱
어쩌다보니 글 쓰고 있는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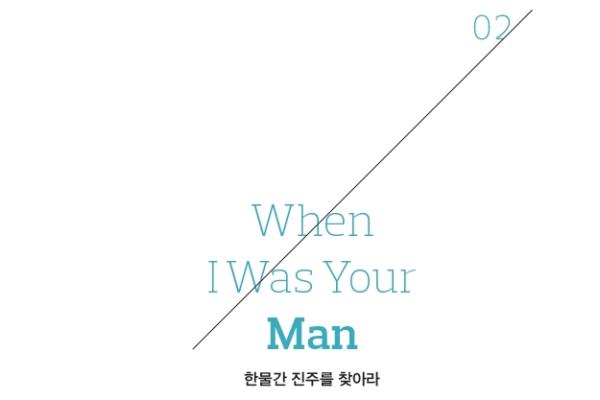
이 얼마 만에 얻은 ‘꿀잠’인가요. <이웃집 꽃미남>이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꽃미남’도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것 같네요. 그래도 <꽃미남 라면가게>에 이어 몇몇 분이 사랑해주시는 걸 보면 ‘Something New’를 고민한 보람이 있군요. 이번 작업의 키워드는 ‘힐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이 어두운 여주인공과 조증 남주인공의 ‘케미’에서 나오는 치유를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화판에서 자랐는데요. 제작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2년은 걸리는 영화를 과연 몇 년 뒤의 트렌드까지 예측해서 작업할까요? 아니겠죠. ‘반드시 뜬다’고 생각했던 영화가 흥행에 참패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 지금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세요. 아마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조차도 ‘천만 관객’을 넘으리라 예상하진 못하셨을 거예요. 하하.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잔뼈가 굵어 그런지, 저는 ‘Back to the Basic’을 선호합니다. 지금 저에게 문화적 만족감을 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에요. 고전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그때의 취향을 지금에 완벽히 녹여낸다면, 매우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넌센스와 센스를 가르는 기준은 ‘사회의 편견’이고, 그 선을 우는 지우개가 바로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Bruno Mars의 ‘When I Was Your Man’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모두가 이제 한물갔다고 생각했던 촌스러움 속에서도 분명 반짝이는 진주가 숨어 있습니다.
정정화
씨스타의 ‘Whoo whoo whoo whoo~’를 흥얼거리는
PD+영화감독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요새 트렌드가 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트렌드를 예측하기란 점점 어려워진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사람들 삶의 방식이 예전보다 많이 세련된 까닭이 아닐까? 무조건 얼리어답터가 먹어주던 시절은 끝났다. 구형 타텍을 12년째 쓰면서도 ‘이게 내 모습이야’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즉, 사람들이 트렌드가 아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다. (어떤 잡지의 표현처럼, ‘무심한 듯 시크한’ 태도가 트렌드인 건가?!) 아무튼 트렌드를 예측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은 ‘트렌드’라는 미명 아래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케팅을 일삼는 한국 기업에겐 새로운 전환점이지도 모른다. 어떤 트렌드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렌지캬라과 가인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고수하다 보니 ‘센스’가 된 케이스 아닐까. 처음엔 노래가 아닌 ‘앙탈’을 부리는 오캬와 ‘짱딸막한’ 인의 섹시 콘셉트가 기획사의 과욕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3년째 줄기차게 싱글을 들고 나왔을 땐 ‘그래, 너네 원래 그런 들이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오캬의 요상함은 ‘병맛’이지만 왠지 빠져들고, 가인은 섹시함은 연구하고, 가지고 놀고, 즐기는 지에 이르렀다! 처음엔 말도 안 됐던 그 콘셉트가 그냥 ‘척’이 아닌 ‘진짜’(identity)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는 것 아닐까. 넥스트 난센스가 뭐일 것 같냐고? 감히 예측하자면, ‘쓸데없는 고퀄리티’(Minor Detailism 정도?) 아닐까? 최근 제가 된 ‘레밀리터리블’이나 ‘붕어싸만코’를 보면 깨알 같은 디테일이 그득하다. 하등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참 열심히도 만들었다. 저걸 만들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재미있었을까? 부러움마저 든다. 세상만사 지친 사람들을 입하게 하는 건 결국, 쓰잘데기 없어도 ‘재미’ 아니겠는가.
이가영
남편이 지적인 ‘병맛’이라 결혼했다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새색시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지금처럼 무색한 때가 있을까요. 요즘은 예측할 수 있건, 예측할 수 없건 ‘트렌드’ 자체가 다른 형태로 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지 알 수 없게, 지나치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마치 조용히 부는 람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네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숨가쁘게 움직이는 트렌드를 재빨리 포착해야 하는 광고와 ‘미술’의 흐름은 분명 다를 테니까요. 제가 몸담은 갤러리팩토리가 아무리 현대미술을 중점으로 다룬다 해도 그 점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몇 년간 ‘식물’에 푹 빠져 있어요. 짬이 날 때마다 나무 사진을 찍어서 개인 홈페이지(www.hejj.co.kr)에 올리지요. 다육식물도 키우고 있고요, 도시에 숨어 있는 나무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기도해요. 수시로 “정말 좋아!”를 외칠 만큼 좋아하게 되었는데, 왜 좋은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넌센스’일지도 르죠. 하지만 전 넌센스와 센스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제대로 된 ‘sense’라고 봐요. 또 어떻게 보자면 sense라는 단어 자체도 넌센스 아닌가요? 큐레이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윤호 작가(leeyunho.tumblr.com)를 ‘Next Nonsense’로 추천하겠어요. 사진을 찍지만 다양한 오브제 작업으로도 풀어내고, 무얼 하든 그 친구의 특별한 시각이 묻어나서 보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죠. 저처럼 강남스타일 말고 ‘이윤호스타일’이 궁금하신 분은, 갤러리팩토리에서 매년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versus> 프로젝트를 기대해주세요! 될성부른 신진작가는 아직 넌센스일 때 보는 재미가 남다르답니다.
노혜정
아직은 ‘안경’을 벗는 데 용기가 필요한
큐레이터